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는 자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담긴 문장이다. 시인 허연은 이를 자기 책상 위에 써 붙여 두었다. 니체의 아포리즘을 그가 삶의 금언으로 삼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절이 허연 시를 읽는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다섯 번째 시집, 허연 스스로 “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있었던 거구나 하는 인정”을 한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는 본인을 포함해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는자”들을 세상 곳곳에서 포착해 시로 써냈으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허연 시가 쓸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는 그의 사랑이 곡진하게 녹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 데나 사랑을 갖다 붙인 게 아니다. 나도 사랑이라는 개념어와 쓰임새가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절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혼곤한 밤을 보내며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를 느릿느릿 읽는 동안, 나는 그의 시를 평하는 식상한 수식어인 비관적 허무보다는, 비관적 허무에서 도망치지 못해 그것마저 껴안은 사랑의 주재자가 (적어도 현재의) 허연에게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시에서 사랑하면 연상되는 어떤 온기를 가득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허연 시를 제대로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이리라. 그가 출간한 시집 제목을 빌려 표현하자. 허연 시는 ‘불온한 검은 피’를 가진 ‘나쁜 소년’이 온건한 척하는 세계의 위선에 돌을 던진 혹독한 싸움의 기록이었다.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의 기조도 다르지 않다. 다만 비관적 허무에 기반을 둔 반항의 키워드로만 허연 시가 독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모든 존재의 가엾음을 가여워하기. 그가 밝힌 대로 이것이 시인이 가진 태도의 기본 값이기 때문이다. 허연의 시선은 “녹초가 된 채 살아만 있는 지하철”(「만원 지하철의 나비」 부분)이나, “말줄임표가 많은 해장국집”(「24시 해장국」 부분) 등 생활 공간에 밀착한다. 거기에 그가 자리해 있어서다. 허연은 영민한 시인인 동시에 성실한, 그러나 대부분 그렇듯 먹고사는 일에 비애를 품은 직장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는 시가 있을 법한 뻔한 장소로 가서 그럴 듯한 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여기에 시가 있나 싶은 곳에서 처연한 시를 길어 올린다.
그러니까 위에 옮겼던 허연의 발언, “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있었던 거구나 하는 인정”은 그의 인생이 시적 인식으로 이행한 결과다. 이런 까닭에 허연 시는 내용 없음을 사변적인 난해함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쉽다기보다 진솔하고 구체성을 띤다는 뜻이다. 그의 시는 그래서 통속적이지 않으나 대중적으로 읽힌다. 허연 시집을 손에 드는 독자가 많은 이유다. 물론 진솔하고 구체적이라서 팽팽한 시적 긴장감이 유지되지 못한 시도 있다. “준비된 실패”를 되풀이하는 비정한 세상을 ‘트램펄린’으로 치환한 시가 그렇다. ‘나’는 차라리 트램펄린 따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쓴다. “그렇지만 아쉽다 / 날아오르는 몇 초가 달콤했기 때문에”(「트램펄린」 부분). 「구내식당」처럼 이 시구는 지나치게 설명적이다 .
그러나 이제와 고백하건대 나는 허연의 팬이다. (지금까지 그가 낸 시집을 전부 소장하고 있고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도 서점에 배포되자마자 구입해 읽었다. 뒷광고 아니다. 내 돈 주고 산 시집 후기다.) 문학평론가로서 나는 허연 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지만, 팬으로서 내가 가진 그의 시에 대한 애정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번 시집 역시 자꾸 따라 부르게 만드는 절창의 연애-이별시가 빛나서다. 허연은 애달프고 구슬프게 회자정리와 거자필반을 이야기한다. 한데 놀라울 정도로 청승맞지 않다. ‘당신’과 ‘나’, 우리가 공유한 감정의 (불)연속적 흐름을 들여다보되 이에 취하지 않아서다. 먼저 우는 가수에게 청중은 감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연유로 그의 곡조는 독자를 공명시킨다. 아래의 시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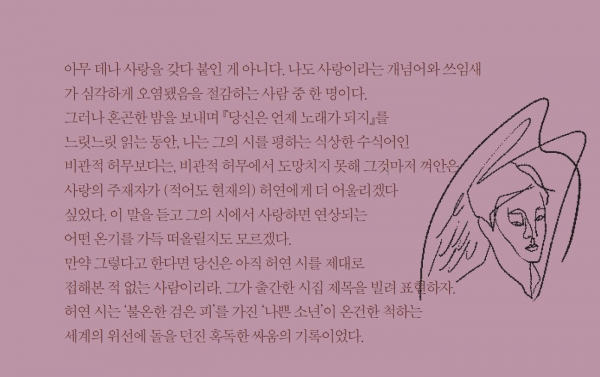
“사랑이 끓어넘치던 어느 시절을 이제는 복원하지 못하지. 그 어떤 불편과 불안도 견디게 하던 육체의 날들을 되살리지 못하지. 적도 잊어버리게 하고, 보물도 버리게 하고, 행운도 걷어차던 나날을 회복하지 못하지. // 그래도 약속한 일은 해야 해서 / 재회라는 게 어색하기는 했지만. // 때맞춰 들어온 햇살에 절반쯤 어두워진 너. 수다스러워진 너. 여전히 내 마음에 포개지던 너. // 누가 더 많이 그리워했었지. / 오늘의 경건함도 지하철 끊어질 무렵이면 다 수포로 돌아가겠지만 / 서로 들고 왔던 기억. 그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그것이 저주였음을. // 재회는 슬플 일도 기쁠 일도 아니었음을. / 오래전 노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 그리움 같은 건 들키지 않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를. / 지금 이 진공관 안에서 끝끝내 중심 잡기를. // 당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 것이며 / 어디에도 속하지 말기를. /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발각되지 않기를.”
(「우리의 생애가 발각되지 않기를」 전문)
이해해야 할 시가 아니라 납득되는 시이므로 따로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이것은 언급해두고 싶다. 기형도가 1989년 세상을 떠나지 않고 기자로 활동하면서 오늘날까지 시를 썼다면 그 작품은 아마 허연 시와 가장 닮아 있으리라는 확신 말이다. (일찍이 나는 기형도의 팬이었고 그러기에 이후 자연스럽게 허연의 팬이 됐을 테다.) 두 시인의 시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가엾음을 가여워하는 시인이라는 점에서 둘은 유사하다. 그리하여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는 자”인 이들을. 어쩌면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마음이 여려 생긴 셀 수 없는 상처 덕분인지도 모른다. 마음이 딱딱해 상처를 전혀 입지 않는 자들일수록 그 영혼의 깊이가 얕다. 그들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 《쿨투라》 2020년 10월호(통권 7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