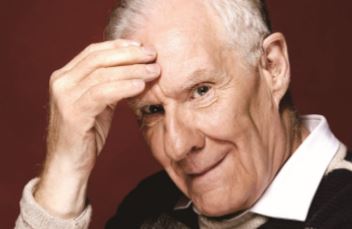
민주주의가 한 단계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가고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합법성 ‘너머beyond’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흔히들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는 법은 도덕의 최소치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법을 전제로 위법, 적법, 편법, 탈법을 얘기하는 수준은 현실에서 제도의 기계적인 부합성 여부, 즉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고 만다.
법은 현실적으로 강력하기는 하지만, 역사의 개방성과 문화의 이상에 더 큰 전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의 진정한 진보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현행법의 현존을 지지·강조하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법이 가리키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너머를 요구해야 한다. 철학자 알랭바디우를 인용하자면 ‘동물적 생존본능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야 ‘진리’에 닿을 수 있다.
조국 장관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가 크게는 ‘정의’, 작게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태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는 계기에 서울대, 고려대생들이 주축이 된 학내 사퇴 촉구 촛불시위 등이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시위가 사안이 지닌 국민적 관심과 ‘공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큰 지지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현상을 ‘인문적’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컬 하게도 촛불시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왜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의문의 지점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촛불도 촛불이고, 조국장관 사퇴 촛불도 촛불이다. 둘 다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전자는 전 국민의 봉화불이 되었고, 후자는 전국민적 확산성과 공감대에 지금까지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왜일까. 난 이 촛불이 지금 현행 사회체제·컬처 ‘너머’에 대한 진정한 요구나 의지가 거세된 채, 어딘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사회적 사태를 두고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것이 진정 발본 색원적 사회 변혁적 열망을 담고 있는 요구인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회의적이라는 거다. ‘공정’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한 세기 전 백정들이 일으킨 형평 운동이나 수십 년 전 전태일이 주장했던 식의 사회 진화에 관한 요구와 비슷한 것이라고 느끼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시위가 ‘청년의 촛불’이라는 점에서는 더욱더 아쉽다. 기성세대 사고방식이나 기득권의식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영감이 스며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유럽의 청년들이 주도한 68운동 같은 미지의 사회적 풍경에 닿으려는 ‘끝까지 가는 시적 열망’이나 예감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를 지금 유행처럼 추세가 된 사회적 상상력의 전형적 양상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통용되고 있는 사회진화나 사회혁신의 양상에서 시위조차 극명한 상상력의 한계, 전복성의 거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예로 생각해 보자. 예컨대 요즘 기업혁신·사회혁신 차원에서 일반화된 개념인 ‘공 유’라는 단어가 진짜 그 실질성을 담보하고 있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유’가 진정한 사회진화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쥐고 있는 직접 이해관계자들 간의 ‘나눔share’을 넘어서, 어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재화가 더 넓은 ‘공공재commons’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의 사용권·접근성을 큰 폭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유’라는 개념은 그 표면만을 소비하는 용어이지, 그 뜻의 핵심을 예민하게 벼려서 새로운 사회를 생산하는 단어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통용되는 사고, 현행법의 전제를 흔들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를 비켜가면, 진짜 진화는 생겨나지 않는다.
내가 대학에 강의를 다니면서 늘 들었던 회의 중 하나는 엄청난 보유량의 지적 자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수들 외에는 그 사용권리를 지역주민·시민들에게 철저히 막아놓은 철통같은 대학도서관의 폐쇄성이다. 심지어 졸업생이나 해당 학기 강의가 끝난 강사에게조차 출입·대여·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게 지금의 대학이다. 그리고 소위 ‘공유의 시대’에 이 방식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그 학교 대학생들이다. 도서관이라는 지적 자원을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배타적 ‘소비자’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한국 대학 시스템 운영의 상당부분은 국민세금, 정부보조금에 빚지고 있다. 교육체제를 진정한 인간진화와 사회개벽의 차원으로 밀어 올리려는 의지나 상상력은 거세한 채,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지금 우리 수준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며 진화하지 못하는 한국민주주의, 한국사회의 한 현실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정부’라는 현정부가 교육 문제에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진정한 사회진화를 리드하려는 의지나 용기를 지닌 것도 전혀 아니다. 세상의 문명사적 변화에 임박해서조차 교육을 진정한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시키는 사회적 의제화에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고작 이런 일이 터져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냐 수시확대냐, 특목고를 폐지하느냐, 뭐 이런 기능적 논의 수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건 실질적 민주주의는커녕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엄청나게 퇴보한 하류 논의다. 사회와 문화의 후진성을 그대로 답습하며,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 기만의 도돌이표다. 교육개혁 논의·여론형성에 대형입시학원 컨설턴트들이 끼어들어 더 전문적 식견을 발휘하고 있고, 시민(?)이 그런 레퍼런스를 더 참조하는 현실이 무얼 뜻하는지 소위 전문가, 관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성찰해 볼 일이다.
* 《쿨투라》 2019년 10월호(통권 64호) *


